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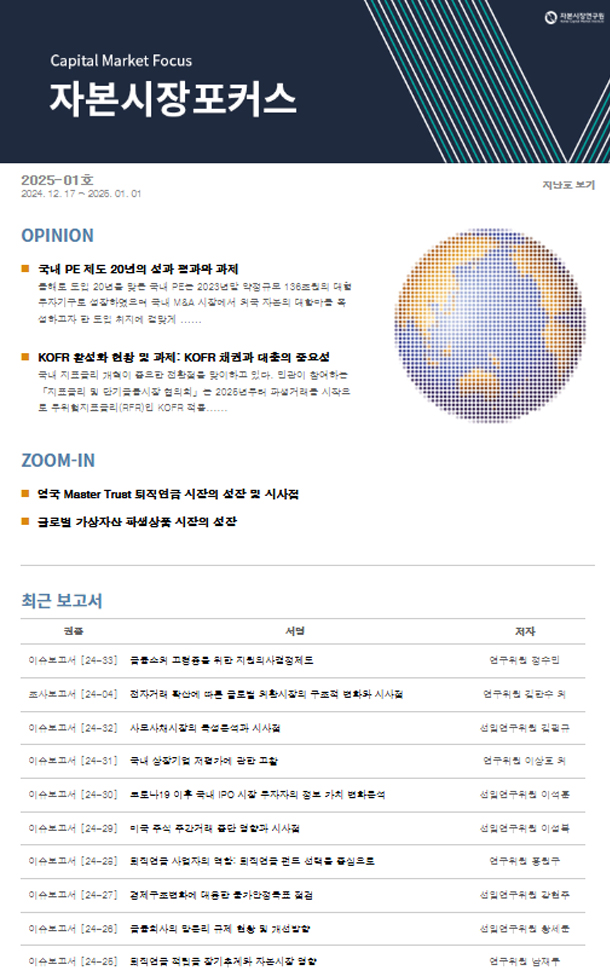
국내 PE 제도 20년의 성과 평과와 과제
2025-01호 2025.01.02
요약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은 국내 PE는 2023년말 약정규모 136조원의 대형 투자기구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M&A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대항마를 육성하고자 한 도입 취지에 걸맞게 국내 M&A 시장과 대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역량 측면에서는 피투자기업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투자 수익률은 해외와 비교가능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내 PE의 지속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출자자 유형의 다변화, 오퍼레이션 가치제고 역량의 강화, 해외투자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지역적, 글로벌 브랜드의 구축, 대외소통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PE의 성장과 그 의의
2024년 12월은 우리나라 PE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제 막 성년이 된 국내 PE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향후 국내 PE 발전 방향의 모색에 있어서 중요하다. 2004년 12월 6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PE 제도가 도입된 이후 PE는 사모펀드 전반의 체계 개편과 맞물려 2015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021년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명칭과 실질이 변화하며 성장해 왔다. 기관전용사모펀드 기준으로 2023년말 국내 PE의 결성규모는 136.4조원, 펀드 수는 1,126개로서 2005~2023년의 19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0.6%, 27.1%이다. 운용사 수도 2007년말 35개에서 2023년말 422개로 연평균 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독립계 운용사 수가 급증하며 전체 운용사 수의 증가를 주도한 결과로서 독립계 운용사 비중은 2007년말 48.6%에서 2023년말 74.9%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PE 제도는 국내 M&A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대항마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국내 PE는 그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PE는 대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비핵심 사업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거래 규모만 30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PE는 국내 M&A 시장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PE는 거래규모와 건수에서 전체 M&A의 10%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거래규모 기준으로 30%, 건수 기준으로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A 시장에서 PE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해외 M&A 시장에서도 PE가 30~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PE는 국내외적으로 자본시장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져 왔다.
국내 PE의 운용역량 및 성과 평가
지난 20년간 국내 PE의 운용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모집-투자-가치제고-회수의 운용 순환국면 각 단계의 특징 및 역량의 분석과 이러한 역량의 집약적 결과인 투자수익률의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 먼저 국내 PE의 자금모집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모집의 집중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 국내 PE 자금모집 집중도는 운용사 수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집중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CR5와 CR102)은 2005년 각각 91.6%, 100.0%에서 2021년 27.4%, 40.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후 2022년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금모집이 어려워지며 재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는 PE 시장의 자금경색기에 소수 선도 운용사를 제외하고는 자금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연도별이 아닌 20년 전체 기간의 자금모집 집중도를 살펴보면 국내 PE는 소수 운용사에 의한 자금모집 집중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자금모집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지표로서 Gini 계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3) 운용사별 누적 결성규모의 Gini 계수는 0.79이다. 한편 이를 5년 단위 시기별로 추정해보면 2004~2007년 0.54, 2008~2012년 0.65, 2013~2017년 0.68, 2018~2022년 0.73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4)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가운데 PE 시장의 성숙도를 자금모집 집중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국내 PE 시장은 미국 PE 대비 후발 시장으로서 2000년대 초반의 미국 시장의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투자 측면에서 한 국가 PE 시장의 성격을 구분하는 대표적 특징은 투자유형별 비중이다. 2005~2023년간 국내 PE의 투자 유형별 비중을 투자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바이아웃(48.6%), 소수지분(48.4%), 공동경영(3.0%) 순인데 바이아웃 투자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반면 2018년 이후 소수지분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후반 고성장 혁신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PE의 소수지분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각 주체 기준으로는 기업과 개인이 주요 매각 주체인 가운데 2005~2023년 매각 주체 비중은 기업(66.8%), 개인(21.9%), PE(6.4%) 순이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매각 주체로서 개인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장 정체에 직면한 중소기업 지분을 국내 PE가 인수한 중소형 바이아웃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PE가 매도 주체인 경우(즉, 세컨더리 거래)는 2012년 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8.9%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2005~2023년간 회수 완료된 135건의 PE 투자에서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5)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내 PE는 투자 후 평균 3.8년간 기업가치를 평균 35%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가치 증가는 매출액 증가, 이익률 증가, 가치평가배수 증가로 분해되는데6) 분석 결과 기업가치 증가분의 73.3%가 매출액 성장에서, 36.2%가 가치평가배수의 증가에서 나온 반면, 이익률 감소로 기업가치 증가분의 9.5%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PE는 매출액 증가, 이익률 증가, 가치평가배수의 증가가 모두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국내 PE의 가치제고 활동은 성장성 제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7)8)
회수 관점에서 국내 PE의 회수방식별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2023년간 M&A(63.7%), 세컨더리(22.2%), 상환(8.0%), IPO(4.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1년 이후 M&A를 통한 회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세컨더리 회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PE 결성규모의 증가와 신생운용사 참여 등 경쟁 심화로 투자처 발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회수가 임박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보유한 운용사와 미집행약정액(dry powder) 소진 필요성을 가진 운용사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PE의 투자 수익률 분석을 위해 2005~2023년간 회수 완료된 231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PE는 주식시장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성과 지표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초과수익률(Ex-IRR)과 KS-PME를 분석한 결과 초과수익률 평균은 22.9%, KS-PME 평균은 1.82로 분석되어9) 국내 PE는 주식시장 대비 높은 수준의 초과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로 분석된다. 또한 초과성과는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바이아웃 투자가 소수지분 투자보다, 비상장기업 투자가 상장기업 투자보다, 해외 운용사 및 독립계 운용사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종합하면 아직까지 해외 선도 수준 PE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PE는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하는 성장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PE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용사 수가 급증하며 경쟁이 촉진되었고 PE 결성규모의 양극화를 통해 이른바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중소기업 바이아웃과 소수지분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잠재적 성장성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만 선도 운용사의 가치제고와 투자수익 창출 역량이 일정 부분 검증되었지만 업계 평균 운용역량은 해외 평균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PE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국내 PE는 향후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PE의 지속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위한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자 유형의 다변화이다. 단조로운 출자자 구성은 자금모집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데 국내 PE 출자자 구성은 연기금ㆍ공제회, 일반법인, 금융회사 등으로서 해외와 비교하여 출자자 유형이 제한적이다. 반면 해외 PE 시장은 공ㆍ사적 연금, 금융회사, 기업, 모펀드, 대학기금, 패밀리오피스, 국부펀드 등 다양한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PE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자금원의 발굴이 동반되어야 하며 신규 유형의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적격 기관출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퍼레이션 측면의 가치제고 역량 강화이다. 국내 PE는 투자 이후의 수익성 제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용절감을 포함하는 전반적 오퍼레이션 관점의 가치제고 역량의 강화를 의미한다. 해외 PE는 출자자와 운용사 모두 성장성ㆍ수익성 제고를 위한 오퍼레이션 측면의 가치제고를 PE 투자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치제고 조직을 운영 중이다. 국내 PE도 관련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투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적 또는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국내 PE는 선도 운용사를 중심으로 국내에 설정된 역내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역외펀드 결성을 통해 해외 출자자 유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적 또는 글로벌 PE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해외 주요 PE 운용사들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자국 내 경쟁심화 및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활발히 해외로 진출한 바 있다.
넷째, 대외소통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강화이다. 국내 PE는 급성장한 규모 만큼이나 국내 상장 대기업의 바이아웃, 공개매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소수주주의 불만, 일부 국내 대형 PE 운용사의 경영권 분쟁 참여, 행동주의 PE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일반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해외 PE 운용사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투자 대상 및 방식에 뒤따르는 평판 위험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향후 국내 PE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와 광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업계 공동의 대외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1) 본문 내용의 일부는 박용린(2024)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고 있다. 박용린, 2024, 국내 PEF의 가치제고와 투자성과 분석: 제도 도입 20년의 평가,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4-22.
2) CR5(CR10)는 전체 자금모집액 대비 상위 5개(10개) 운용사의 합산 자금모집액 비중이다.
3) Gini 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1의 값을 가지며 0은 소득분배의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4) 미국 PE의 동기간 자금모집의 Gini 계수는 각각 0.75, 0.77, 0.80, 0.83으로 나타나 미국 PE 시장에서도 선도 운용사에 의한 자금모집의 집중도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Lietz, N.G., Chvanov, P., 2024, Does the case for private equity still hold?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24-066.
5) 기업가치는 가치평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EV(Enterprise Value)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6) 매출액 증가 및 이익률 증가 같은 경영성과 개선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도 가능하다.
7) 구체적으로 해외 PE의 경우 매출액 증가, 이익률 증가, 가치평가배수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5년의 경우 각각 38%, 14%, 48%, 2016~2021년의 경우 각각 38%, 6%, 56%이다. Bain & Company, 2022,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2022.
8) 국내 PE의 수익성 개선이 미흡한 측면은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PE 투자 전체를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박용린, 2021, 국내 PEF의 평가와 향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9.
9) 초과수익률(Ex-IRR)은 PE 투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부수익률(IRR)에서 PE 투자에 따르는 현금흐름 유출액(즉, 투자)과 유입액(배당, 유상감자, 회수액)을 회수 시점까지 주식시장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의 IRR을 차감한 수익률로 정의한다. 또한 KS(Kaplan-Schoar) PME는 PE 투자의 현금흐름의 유입액과 유출액을 회수 시점까지 주식시장 수익률로 운용한 평가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2024년 12월은 우리나라 PE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제 막 성년이 된 국내 PE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향후 국내 PE 발전 방향의 모색에 있어서 중요하다. 2004년 12월 6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PE 제도가 도입된 이후 PE는 사모펀드 전반의 체계 개편과 맞물려 2015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021년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명칭과 실질이 변화하며 성장해 왔다. 기관전용사모펀드 기준으로 2023년말 국내 PE의 결성규모는 136.4조원, 펀드 수는 1,126개로서 2005~2023년의 19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0.6%, 27.1%이다. 운용사 수도 2007년말 35개에서 2023년말 422개로 연평균 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독립계 운용사 수가 급증하며 전체 운용사 수의 증가를 주도한 결과로서 독립계 운용사 비중은 2007년말 48.6%에서 2023년말 74.9%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PE 제도는 국내 M&A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대항마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국내 PE는 그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PE는 대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비핵심 사업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거래 규모만 30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PE는 국내 M&A 시장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PE는 거래규모와 건수에서 전체 M&A의 10%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거래규모 기준으로 30%, 건수 기준으로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A 시장에서 PE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해외 M&A 시장에서도 PE가 30~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PE는 국내외적으로 자본시장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져 왔다.
국내 PE의 운용역량 및 성과 평가
지난 20년간 국내 PE의 운용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모집-투자-가치제고-회수의 운용 순환국면 각 단계의 특징 및 역량의 분석과 이러한 역량의 집약적 결과인 투자수익률의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 먼저 국내 PE의 자금모집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모집의 집중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 국내 PE 자금모집 집중도는 운용사 수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집중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CR5와 CR102)은 2005년 각각 91.6%, 100.0%에서 2021년 27.4%, 40.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후 2022년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금모집이 어려워지며 재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는 PE 시장의 자금경색기에 소수 선도 운용사를 제외하고는 자금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연도별이 아닌 20년 전체 기간의 자금모집 집중도를 살펴보면 국내 PE는 소수 운용사에 의한 자금모집 집중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자금모집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지표로서 Gini 계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3) 운용사별 누적 결성규모의 Gini 계수는 0.79이다. 한편 이를 5년 단위 시기별로 추정해보면 2004~2007년 0.54, 2008~2012년 0.65, 2013~2017년 0.68, 2018~2022년 0.73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4)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가운데 PE 시장의 성숙도를 자금모집 집중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국내 PE 시장은 미국 PE 대비 후발 시장으로서 2000년대 초반의 미국 시장의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투자 측면에서 한 국가 PE 시장의 성격을 구분하는 대표적 특징은 투자유형별 비중이다. 2005~2023년간 국내 PE의 투자 유형별 비중을 투자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바이아웃(48.6%), 소수지분(48.4%), 공동경영(3.0%) 순인데 바이아웃 투자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반면 2018년 이후 소수지분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후반 고성장 혁신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PE의 소수지분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각 주체 기준으로는 기업과 개인이 주요 매각 주체인 가운데 2005~2023년 매각 주체 비중은 기업(66.8%), 개인(21.9%), PE(6.4%) 순이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매각 주체로서 개인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장 정체에 직면한 중소기업 지분을 국내 PE가 인수한 중소형 바이아웃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PE가 매도 주체인 경우(즉, 세컨더리 거래)는 2012년 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8.9%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2005~2023년간 회수 완료된 135건의 PE 투자에서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5)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내 PE는 투자 후 평균 3.8년간 기업가치를 평균 35%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가치 증가는 매출액 증가, 이익률 증가, 가치평가배수 증가로 분해되는데6) 분석 결과 기업가치 증가분의 73.3%가 매출액 성장에서, 36.2%가 가치평가배수의 증가에서 나온 반면, 이익률 감소로 기업가치 증가분의 9.5%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PE는 매출액 증가, 이익률 증가, 가치평가배수의 증가가 모두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국내 PE의 가치제고 활동은 성장성 제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7)8)
회수 관점에서 국내 PE의 회수방식별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2023년간 M&A(63.7%), 세컨더리(22.2%), 상환(8.0%), IPO(4.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1년 이후 M&A를 통한 회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세컨더리 회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PE 결성규모의 증가와 신생운용사 참여 등 경쟁 심화로 투자처 발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회수가 임박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보유한 운용사와 미집행약정액(dry powder) 소진 필요성을 가진 운용사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PE의 투자 수익률 분석을 위해 2005~2023년간 회수 완료된 231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PE는 주식시장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성과 지표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초과수익률(Ex-IRR)과 KS-PME를 분석한 결과 초과수익률 평균은 22.9%, KS-PME 평균은 1.82로 분석되어9) 국내 PE는 주식시장 대비 높은 수준의 초과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로 분석된다. 또한 초과성과는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바이아웃 투자가 소수지분 투자보다, 비상장기업 투자가 상장기업 투자보다, 해외 운용사 및 독립계 운용사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종합하면 아직까지 해외 선도 수준 PE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PE는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하는 성장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PE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용사 수가 급증하며 경쟁이 촉진되었고 PE 결성규모의 양극화를 통해 이른바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중소기업 바이아웃과 소수지분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잠재적 성장성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만 선도 운용사의 가치제고와 투자수익 창출 역량이 일정 부분 검증되었지만 업계 평균 운용역량은 해외 평균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PE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국내 PE는 향후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PE의 지속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위한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자 유형의 다변화이다. 단조로운 출자자 구성은 자금모집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데 국내 PE 출자자 구성은 연기금ㆍ공제회, 일반법인, 금융회사 등으로서 해외와 비교하여 출자자 유형이 제한적이다. 반면 해외 PE 시장은 공ㆍ사적 연금, 금융회사, 기업, 모펀드, 대학기금, 패밀리오피스, 국부펀드 등 다양한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PE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자금원의 발굴이 동반되어야 하며 신규 유형의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적격 기관출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퍼레이션 측면의 가치제고 역량 강화이다. 국내 PE는 투자 이후의 수익성 제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용절감을 포함하는 전반적 오퍼레이션 관점의 가치제고 역량의 강화를 의미한다. 해외 PE는 출자자와 운용사 모두 성장성ㆍ수익성 제고를 위한 오퍼레이션 측면의 가치제고를 PE 투자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치제고 조직을 운영 중이다. 국내 PE도 관련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투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적 또는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국내 PE는 선도 운용사를 중심으로 국내에 설정된 역내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역외펀드 결성을 통해 해외 출자자 유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적 또는 글로벌 PE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해외 주요 PE 운용사들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자국 내 경쟁심화 및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활발히 해외로 진출한 바 있다.
넷째, 대외소통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강화이다. 국내 PE는 급성장한 규모 만큼이나 국내 상장 대기업의 바이아웃, 공개매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소수주주의 불만, 일부 국내 대형 PE 운용사의 경영권 분쟁 참여, 행동주의 PE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일반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해외 PE 운용사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투자 대상 및 방식에 뒤따르는 평판 위험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향후 국내 PE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와 광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업계 공동의 대외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1) 본문 내용의 일부는 박용린(2024)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고 있다. 박용린, 2024, 국내 PEF의 가치제고와 투자성과 분석: 제도 도입 20년의 평가,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4-22.
2) CR5(CR10)는 전체 자금모집액 대비 상위 5개(10개) 운용사의 합산 자금모집액 비중이다.
3) Gini 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1의 값을 가지며 0은 소득분배의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4) 미국 PE의 동기간 자금모집의 Gini 계수는 각각 0.75, 0.77, 0.80, 0.83으로 나타나 미국 PE 시장에서도 선도 운용사에 의한 자금모집의 집중도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Lietz, N.G., Chvanov, P., 2024, Does the case for private equity still hold?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24-066.
5) 기업가치는 가치평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EV(Enterprise Value)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6) 매출액 증가 및 이익률 증가 같은 경영성과 개선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도 가능하다.
7) 구체적으로 해외 PE의 경우 매출액 증가, 이익률 증가, 가치평가배수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5년의 경우 각각 38%, 14%, 48%, 2016~2021년의 경우 각각 38%, 6%, 56%이다. Bain & Company, 2022,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2022.
8) 국내 PE의 수익성 개선이 미흡한 측면은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PE 투자 전체를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박용린, 2021, 국내 PEF의 평가와 향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9.
9) 초과수익률(Ex-IRR)은 PE 투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부수익률(IRR)에서 PE 투자에 따르는 현금흐름 유출액(즉, 투자)과 유입액(배당, 유상감자, 회수액)을 회수 시점까지 주식시장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의 IRR을 차감한 수익률로 정의한다. 또한 KS(Kaplan-Schoar) PME는 PE 투자의 현금흐름의 유입액과 유출액을 회수 시점까지 주식시장 수익률로 운용한 평가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